여론 뭇매 ‘대주주’ 기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입력 2025.08.04 (21:30)
수정 2025.08.04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집 팔아서 번 돈과 주식 거래로 번 돈.
둘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부동산 차익은 소득세를 내지만, 국내 주식 거래로 번 돈은 세금을 안 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대주주'는 차익의 최고 25%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럼 누가 '대주주'냐, 그 기준이 관건이겠죠.
지금은 특정 종목을 '5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인데, 이를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계획이 세제 개편안에 담겼습니다.
반발이 큽니다.
계획을 철회하란 국회 청원에 닷새 동안 13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여당 대표도 빨리 정리하겠다며 수습하고 나섰는데요.
10억 기준을 고수할지, 수정할지 미지수지만, 금액 기준보다 더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KBS 뉴스 9/1999년 8월 : "재벌 등 대주주의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1999년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상장사 대주주는 매매차익에 세금을 냅니다.
처음엔 지분 5% 이상.
이듬해엔 지분 3%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주주인 재벌 총수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하한선은 꾸준히 내려갑니다.
2020년 '10억 원 이상'까지 내렸고, 2024년 '50억 원 이상'으로 처음 오릅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4억 원입니다. 그런데 (종목당) 주식 10억 원에 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평가액으로 과세냐 비과세냐를 끊다 보니, 실제 이익과 세금이 불일치합니다.
특정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했다면 주식을 조금 팔아 100만 원만 벌어도 세금을 내는데, 9억 9천만 원을 보유한 투자자가 대량 매도로 1억을 벌어도 비과세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소득 기반의 보편 과세가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보는데, 거래를 많이 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면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죠."]
12월 마지막 거래일 하루만 주식을 줄이면 세금을 피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연말이 올수록 '큰손들' 매도가 몰려 주가가 떨어지니, 개미 투자자까지 불만을 갖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송치승/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 "(파는 주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불필요한 변동성을 야기하는 게 시장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유사 논란 자체가 없습니다.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매매차익엔 다 세금을 냅니다.
이런 취지로 도입하려 했던 게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연기를 거듭하다 올해 초 폐지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박미주
집 팔아서 번 돈과 주식 거래로 번 돈.
둘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부동산 차익은 소득세를 내지만, 국내 주식 거래로 번 돈은 세금을 안 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대주주'는 차익의 최고 25%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럼 누가 '대주주'냐, 그 기준이 관건이겠죠.
지금은 특정 종목을 '5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인데, 이를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계획이 세제 개편안에 담겼습니다.
반발이 큽니다.
계획을 철회하란 국회 청원에 닷새 동안 13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여당 대표도 빨리 정리하겠다며 수습하고 나섰는데요.
10억 기준을 고수할지, 수정할지 미지수지만, 금액 기준보다 더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KBS 뉴스 9/1999년 8월 : "재벌 등 대주주의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1999년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상장사 대주주는 매매차익에 세금을 냅니다.
처음엔 지분 5% 이상.
이듬해엔 지분 3%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주주인 재벌 총수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하한선은 꾸준히 내려갑니다.
2020년 '10억 원 이상'까지 내렸고, 2024년 '50억 원 이상'으로 처음 오릅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4억 원입니다. 그런데 (종목당) 주식 10억 원에 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평가액으로 과세냐 비과세냐를 끊다 보니, 실제 이익과 세금이 불일치합니다.
특정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했다면 주식을 조금 팔아 100만 원만 벌어도 세금을 내는데, 9억 9천만 원을 보유한 투자자가 대량 매도로 1억을 벌어도 비과세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소득 기반의 보편 과세가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보는데, 거래를 많이 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면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죠."]
12월 마지막 거래일 하루만 주식을 줄이면 세금을 피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연말이 올수록 '큰손들' 매도가 몰려 주가가 떨어지니, 개미 투자자까지 불만을 갖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송치승/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 "(파는 주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불필요한 변동성을 야기하는 게 시장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유사 논란 자체가 없습니다.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매매차익엔 다 세금을 냅니다.
이런 취지로 도입하려 했던 게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연기를 거듭하다 올해 초 폐지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론 뭇매 ‘대주주’ 기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
- 입력 2025-08-04 21:30:18
- 수정2025-08-04 22:05:22

[앵커]
집 팔아서 번 돈과 주식 거래로 번 돈.
둘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부동산 차익은 소득세를 내지만, 국내 주식 거래로 번 돈은 세금을 안 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대주주'는 차익의 최고 25%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럼 누가 '대주주'냐, 그 기준이 관건이겠죠.
지금은 특정 종목을 '5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인데, 이를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계획이 세제 개편안에 담겼습니다.
반발이 큽니다.
계획을 철회하란 국회 청원에 닷새 동안 13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여당 대표도 빨리 정리하겠다며 수습하고 나섰는데요.
10억 기준을 고수할지, 수정할지 미지수지만, 금액 기준보다 더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KBS 뉴스 9/1999년 8월 : "재벌 등 대주주의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1999년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상장사 대주주는 매매차익에 세금을 냅니다.
처음엔 지분 5% 이상.
이듬해엔 지분 3%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주주인 재벌 총수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하한선은 꾸준히 내려갑니다.
2020년 '10억 원 이상'까지 내렸고, 2024년 '50억 원 이상'으로 처음 오릅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4억 원입니다. 그런데 (종목당) 주식 10억 원에 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평가액으로 과세냐 비과세냐를 끊다 보니, 실제 이익과 세금이 불일치합니다.
특정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했다면 주식을 조금 팔아 100만 원만 벌어도 세금을 내는데, 9억 9천만 원을 보유한 투자자가 대량 매도로 1억을 벌어도 비과세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소득 기반의 보편 과세가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보는데, 거래를 많이 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면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죠."]
12월 마지막 거래일 하루만 주식을 줄이면 세금을 피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연말이 올수록 '큰손들' 매도가 몰려 주가가 떨어지니, 개미 투자자까지 불만을 갖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송치승/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 "(파는 주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불필요한 변동성을 야기하는 게 시장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유사 논란 자체가 없습니다.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매매차익엔 다 세금을 냅니다.
이런 취지로 도입하려 했던 게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연기를 거듭하다 올해 초 폐지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박미주
집 팔아서 번 돈과 주식 거래로 번 돈.
둘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부동산 차익은 소득세를 내지만, 국내 주식 거래로 번 돈은 세금을 안 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대주주'는 차익의 최고 25%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럼 누가 '대주주'냐, 그 기준이 관건이겠죠.
지금은 특정 종목을 '5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인데, 이를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계획이 세제 개편안에 담겼습니다.
반발이 큽니다.
계획을 철회하란 국회 청원에 닷새 동안 13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여당 대표도 빨리 정리하겠다며 수습하고 나섰는데요.
10억 기준을 고수할지, 수정할지 미지수지만, 금액 기준보다 더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KBS 뉴스 9/1999년 8월 : "재벌 등 대주주의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1999년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상장사 대주주는 매매차익에 세금을 냅니다.
처음엔 지분 5% 이상.
이듬해엔 지분 3%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주주인 재벌 총수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하한선은 꾸준히 내려갑니다.
2020년 '10억 원 이상'까지 내렸고, 2024년 '50억 원 이상'으로 처음 오릅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4억 원입니다. 그런데 (종목당) 주식 10억 원에 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평가액으로 과세냐 비과세냐를 끊다 보니, 실제 이익과 세금이 불일치합니다.
특정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했다면 주식을 조금 팔아 100만 원만 벌어도 세금을 내는데, 9억 9천만 원을 보유한 투자자가 대량 매도로 1억을 벌어도 비과세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소득 기반의 보편 과세가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보는데, 거래를 많이 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면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죠."]
12월 마지막 거래일 하루만 주식을 줄이면 세금을 피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연말이 올수록 '큰손들' 매도가 몰려 주가가 떨어지니, 개미 투자자까지 불만을 갖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송치승/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 "(파는 주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불필요한 변동성을 야기하는 게 시장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유사 논란 자체가 없습니다.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매매차익엔 다 세금을 냅니다.
이런 취지로 도입하려 했던 게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연기를 거듭하다 올해 초 폐지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박미주
-
-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김진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단독] “김용현, 군 잇단 반대에도 원점 타격 지시…<br>K9 동원하라”](/data/layer/904/2025/08/20250804_B95hz3.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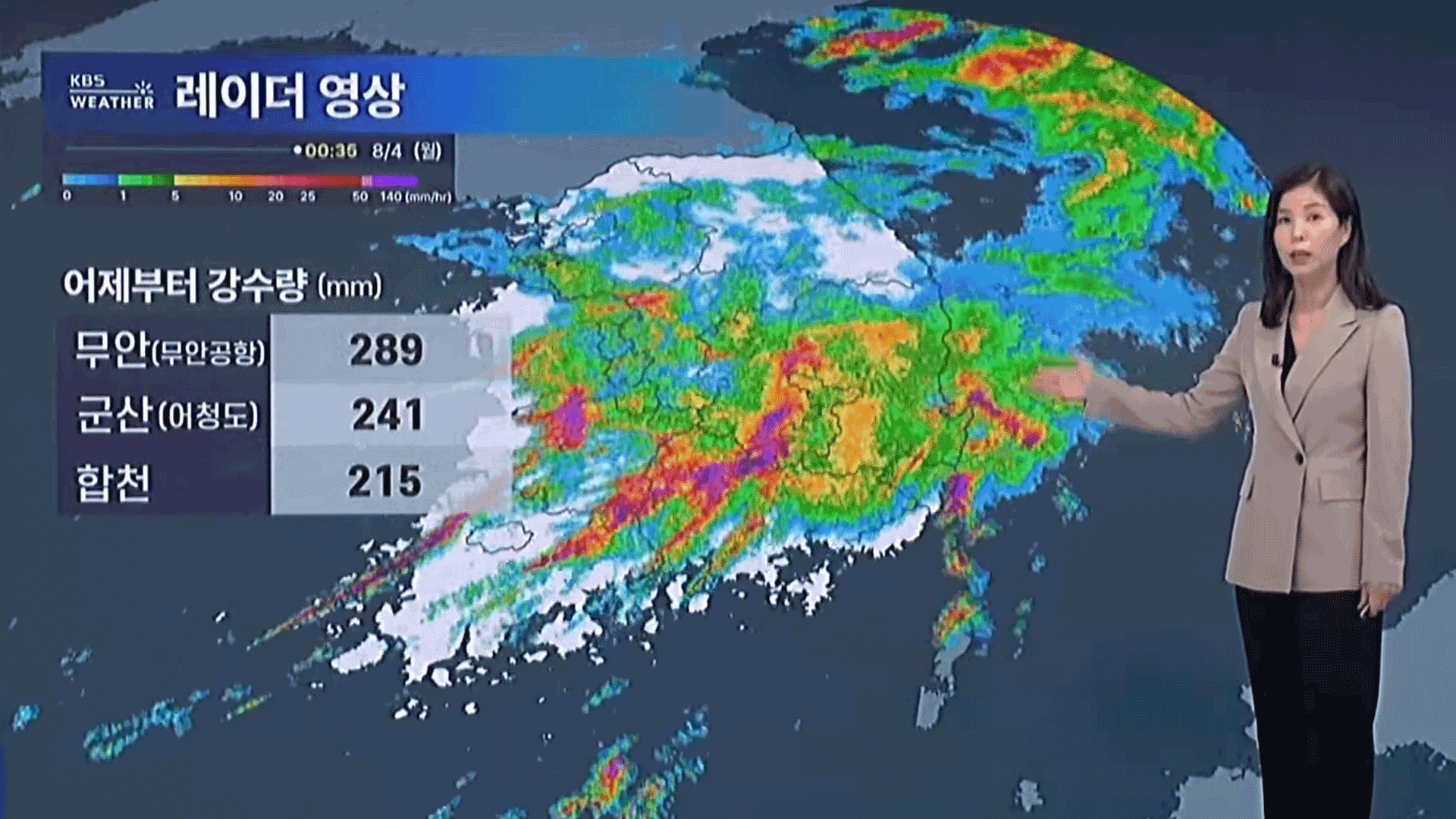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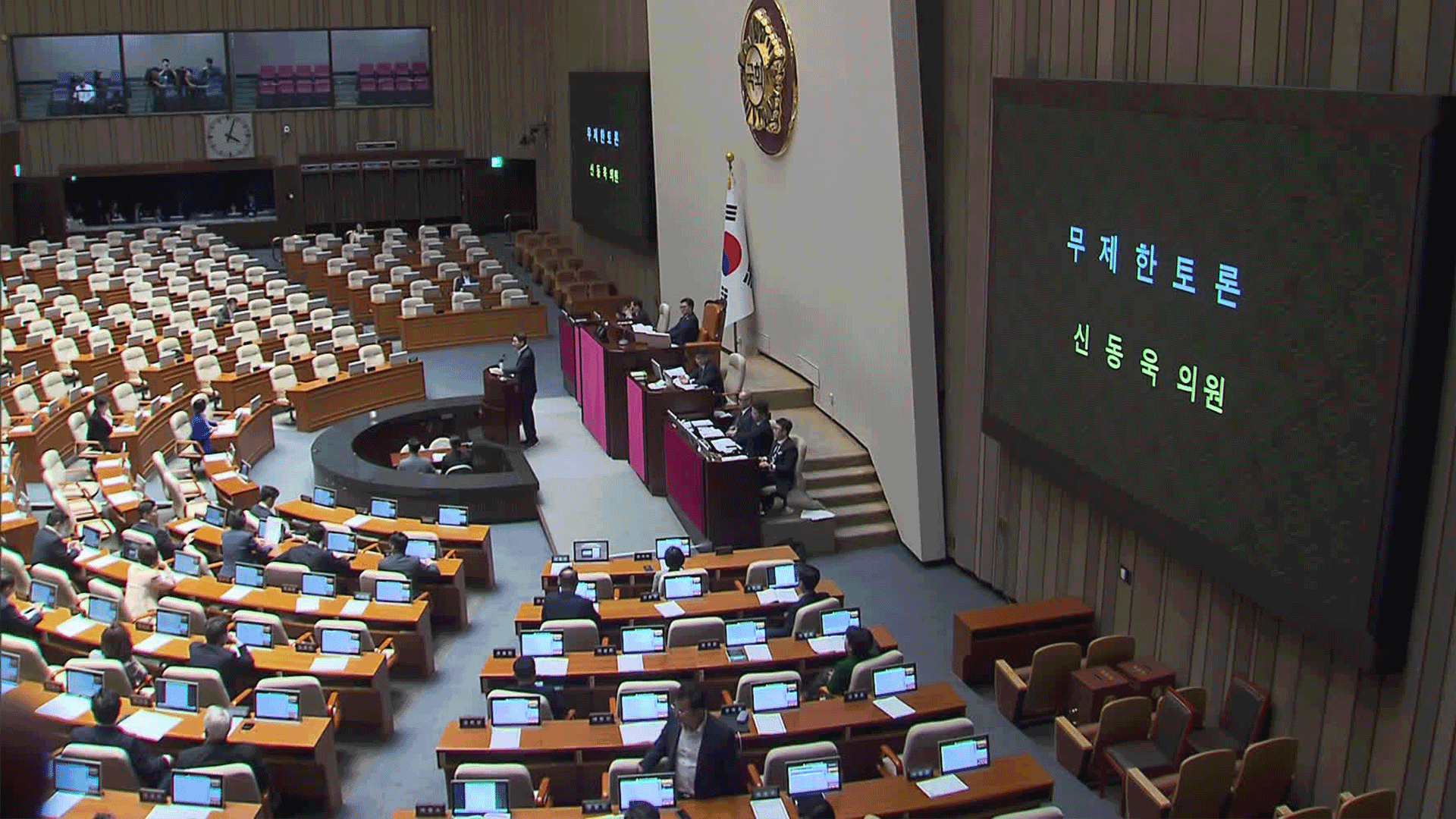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