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긴 폭염, 최대 우려 ‘온열질환’…대비 어떻게?
입력 2025.07.03 (19:10)
수정 2025.07.03 (19: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보신 것처럼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긴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이슈대담', 오늘 이 시간은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와 폭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정말 더웠습니다.
일단 온열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 뭔지, 또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위험 신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온열질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련에서부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 또 아주 심한 경우는 열사병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열사병 같은 경우는 의식 상태가 변하는 것이죠.
갑자기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든지,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하게 됐다든지 또는 뭐 심한 경우에는 소변 색깔이 콜라 색깔같이 아주 까맣게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건 열사병의 어떤 이런 증상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앵커]
특히나 지금 이런 날씨에 야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어떤 작업 환경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답변]
일단 야외 작업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농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가령 택배 기사랄지 또는 배달 기사랄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설 노동자들은 또 자기 그 장비, 여러 가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땀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복사열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땀을 배출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폭염에 취약한 것이 실내 노동자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 노동자 양준혁 씨가 냉방 시설이 없는 실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사고도 있었는데, 실제로 실내 작업도 온열 질환 위험이 있는 건가요?
[답변]
오히려 실내 작업인 경우에 실외 작업보다는 햇빛이 없으니까 더 괜찮겠지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내에서 일을 할 때도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실내에서 이렇게 잘 환기가 안 되는 데, 특히 위험하고. 더구나 습도가 높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더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제 당시에 그 사고에서 사후 조치를 두고도 논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주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까?
[답변]
현장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거기서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의에게 이렇게 의뢰하기 위해서 119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첫째일 것 같습니다.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렇게 옷을 벗겨준다든지, 시원한 곳에 옮긴다든지, 또는 이렇게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쐬서 체온을 빨리 낮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양준혁 씨 사건의 경우에 고인이 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더운 환경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에 더 위험한 건가요?
[답변]
아, 그렇죠.
대개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사고가 난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서 첫 훈련하다가 사고 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가령 건설 노동자는 날마다 더운 데서 일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은 이미 더운 환경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8시간씩 일 못하게 하고, 처음에는 한 2시간,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20%씩 늘려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적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고온 순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 양준혁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만에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이제 이렇게 적응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무더운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좀 점진적으로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 분들이 좀 알아야 될 상식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작업할 때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다른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합해지면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는 33도 이상 이렇게 고온 하에서 일할 때는 하루에 2시간 이내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경총에서 중소기업에 너무 부담이 된다 해서 그거를 권고 기준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게, 서늘한 곳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실제 사고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노력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사실 그 작업하고 관련된, 의심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첫째는 산재는 본인이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판단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의사들의 어떤 진단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너무 탈수가 심해서 이렇게 급성 심부전이 왔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급성 심부전이라고만 판단을 하면 이게 온열 질환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잘 모르겠다 하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병 안심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조치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폭염이 일터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된 만큼 이제 인식 전환, 그리고 제도적 개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슈 대담',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긴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이슈대담', 오늘 이 시간은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와 폭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정말 더웠습니다.
일단 온열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 뭔지, 또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위험 신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온열질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련에서부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 또 아주 심한 경우는 열사병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열사병 같은 경우는 의식 상태가 변하는 것이죠.
갑자기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든지,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하게 됐다든지 또는 뭐 심한 경우에는 소변 색깔이 콜라 색깔같이 아주 까맣게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건 열사병의 어떤 이런 증상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앵커]
특히나 지금 이런 날씨에 야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어떤 작업 환경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답변]
일단 야외 작업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농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가령 택배 기사랄지 또는 배달 기사랄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설 노동자들은 또 자기 그 장비, 여러 가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땀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복사열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땀을 배출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폭염에 취약한 것이 실내 노동자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 노동자 양준혁 씨가 냉방 시설이 없는 실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사고도 있었는데, 실제로 실내 작업도 온열 질환 위험이 있는 건가요?
[답변]
오히려 실내 작업인 경우에 실외 작업보다는 햇빛이 없으니까 더 괜찮겠지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내에서 일을 할 때도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실내에서 이렇게 잘 환기가 안 되는 데, 특히 위험하고. 더구나 습도가 높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더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제 당시에 그 사고에서 사후 조치를 두고도 논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주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까?
[답변]
현장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거기서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의에게 이렇게 의뢰하기 위해서 119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첫째일 것 같습니다.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렇게 옷을 벗겨준다든지, 시원한 곳에 옮긴다든지, 또는 이렇게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쐬서 체온을 빨리 낮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양준혁 씨 사건의 경우에 고인이 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더운 환경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에 더 위험한 건가요?
[답변]
아, 그렇죠.
대개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사고가 난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서 첫 훈련하다가 사고 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가령 건설 노동자는 날마다 더운 데서 일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은 이미 더운 환경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8시간씩 일 못하게 하고, 처음에는 한 2시간,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20%씩 늘려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적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고온 순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 양준혁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만에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이제 이렇게 적응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무더운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좀 점진적으로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 분들이 좀 알아야 될 상식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작업할 때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다른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합해지면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는 33도 이상 이렇게 고온 하에서 일할 때는 하루에 2시간 이내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경총에서 중소기업에 너무 부담이 된다 해서 그거를 권고 기준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게, 서늘한 곳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실제 사고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노력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사실 그 작업하고 관련된, 의심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첫째는 산재는 본인이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판단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의사들의 어떤 진단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너무 탈수가 심해서 이렇게 급성 심부전이 왔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급성 심부전이라고만 판단을 하면 이게 온열 질환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잘 모르겠다 하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병 안심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조치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폭염이 일터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된 만큼 이제 인식 전환, 그리고 제도적 개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슈 대담',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대담] 긴 폭염, 최대 우려 ‘온열질환’…대비 어떻게?
-
- 입력 2025-07-03 19:10:06
- 수정2025-07-03 19:23:33

[앵커]
네, 보신 것처럼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긴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이슈대담', 오늘 이 시간은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와 폭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정말 더웠습니다.
일단 온열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 뭔지, 또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위험 신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온열질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련에서부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 또 아주 심한 경우는 열사병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열사병 같은 경우는 의식 상태가 변하는 것이죠.
갑자기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든지,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하게 됐다든지 또는 뭐 심한 경우에는 소변 색깔이 콜라 색깔같이 아주 까맣게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건 열사병의 어떤 이런 증상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앵커]
특히나 지금 이런 날씨에 야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어떤 작업 환경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답변]
일단 야외 작업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농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가령 택배 기사랄지 또는 배달 기사랄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설 노동자들은 또 자기 그 장비, 여러 가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땀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복사열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땀을 배출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폭염에 취약한 것이 실내 노동자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 노동자 양준혁 씨가 냉방 시설이 없는 실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사고도 있었는데, 실제로 실내 작업도 온열 질환 위험이 있는 건가요?
[답변]
오히려 실내 작업인 경우에 실외 작업보다는 햇빛이 없으니까 더 괜찮겠지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내에서 일을 할 때도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실내에서 이렇게 잘 환기가 안 되는 데, 특히 위험하고. 더구나 습도가 높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더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제 당시에 그 사고에서 사후 조치를 두고도 논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주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까?
[답변]
현장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거기서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의에게 이렇게 의뢰하기 위해서 119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첫째일 것 같습니다.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렇게 옷을 벗겨준다든지, 시원한 곳에 옮긴다든지, 또는 이렇게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쐬서 체온을 빨리 낮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양준혁 씨 사건의 경우에 고인이 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더운 환경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에 더 위험한 건가요?
[답변]
아, 그렇죠.
대개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사고가 난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서 첫 훈련하다가 사고 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가령 건설 노동자는 날마다 더운 데서 일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은 이미 더운 환경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8시간씩 일 못하게 하고, 처음에는 한 2시간,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20%씩 늘려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적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고온 순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 양준혁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만에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이제 이렇게 적응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무더운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좀 점진적으로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 분들이 좀 알아야 될 상식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작업할 때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다른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합해지면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는 33도 이상 이렇게 고온 하에서 일할 때는 하루에 2시간 이내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경총에서 중소기업에 너무 부담이 된다 해서 그거를 권고 기준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게, 서늘한 곳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실제 사고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노력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사실 그 작업하고 관련된, 의심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첫째는 산재는 본인이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판단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의사들의 어떤 진단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너무 탈수가 심해서 이렇게 급성 심부전이 왔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급성 심부전이라고만 판단을 하면 이게 온열 질환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잘 모르겠다 하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병 안심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조치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폭염이 일터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된 만큼 이제 인식 전환, 그리고 제도적 개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슈 대담',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긴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이슈대담', 오늘 이 시간은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와 폭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정말 더웠습니다.
일단 온열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 뭔지, 또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위험 신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온열질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련에서부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 또 아주 심한 경우는 열사병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열사병 같은 경우는 의식 상태가 변하는 것이죠.
갑자기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든지,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하게 됐다든지 또는 뭐 심한 경우에는 소변 색깔이 콜라 색깔같이 아주 까맣게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건 열사병의 어떤 이런 증상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앵커]
특히나 지금 이런 날씨에 야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어떤 작업 환경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답변]
일단 야외 작업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농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가령 택배 기사랄지 또는 배달 기사랄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설 노동자들은 또 자기 그 장비, 여러 가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땀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복사열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땀을 배출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폭염에 취약한 것이 실내 노동자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 노동자 양준혁 씨가 냉방 시설이 없는 실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사고도 있었는데, 실제로 실내 작업도 온열 질환 위험이 있는 건가요?
[답변]
오히려 실내 작업인 경우에 실외 작업보다는 햇빛이 없으니까 더 괜찮겠지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내에서 일을 할 때도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실내에서 이렇게 잘 환기가 안 되는 데, 특히 위험하고. 더구나 습도가 높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더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제 당시에 그 사고에서 사후 조치를 두고도 논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주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까?
[답변]
현장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거기서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의에게 이렇게 의뢰하기 위해서 119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첫째일 것 같습니다.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렇게 옷을 벗겨준다든지, 시원한 곳에 옮긴다든지, 또는 이렇게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쐬서 체온을 빨리 낮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양준혁 씨 사건의 경우에 고인이 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더운 환경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에 더 위험한 건가요?
[답변]
아, 그렇죠.
대개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사고가 난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서 첫 훈련하다가 사고 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가령 건설 노동자는 날마다 더운 데서 일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은 이미 더운 환경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8시간씩 일 못하게 하고, 처음에는 한 2시간,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20%씩 늘려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적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고온 순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 양준혁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만에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이제 이렇게 적응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무더운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좀 점진적으로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 분들이 좀 알아야 될 상식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작업할 때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다른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합해지면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는 33도 이상 이렇게 고온 하에서 일할 때는 하루에 2시간 이내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경총에서 중소기업에 너무 부담이 된다 해서 그거를 권고 기준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게, 서늘한 곳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실제 사고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노력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사실 그 작업하고 관련된, 의심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첫째는 산재는 본인이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판단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의사들의 어떤 진단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너무 탈수가 심해서 이렇게 급성 심부전이 왔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급성 심부전이라고만 판단을 하면 이게 온열 질환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잘 모르겠다 하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병 안심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조치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폭염이 일터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된 만큼 이제 인식 전환, 그리고 제도적 개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슈 대담',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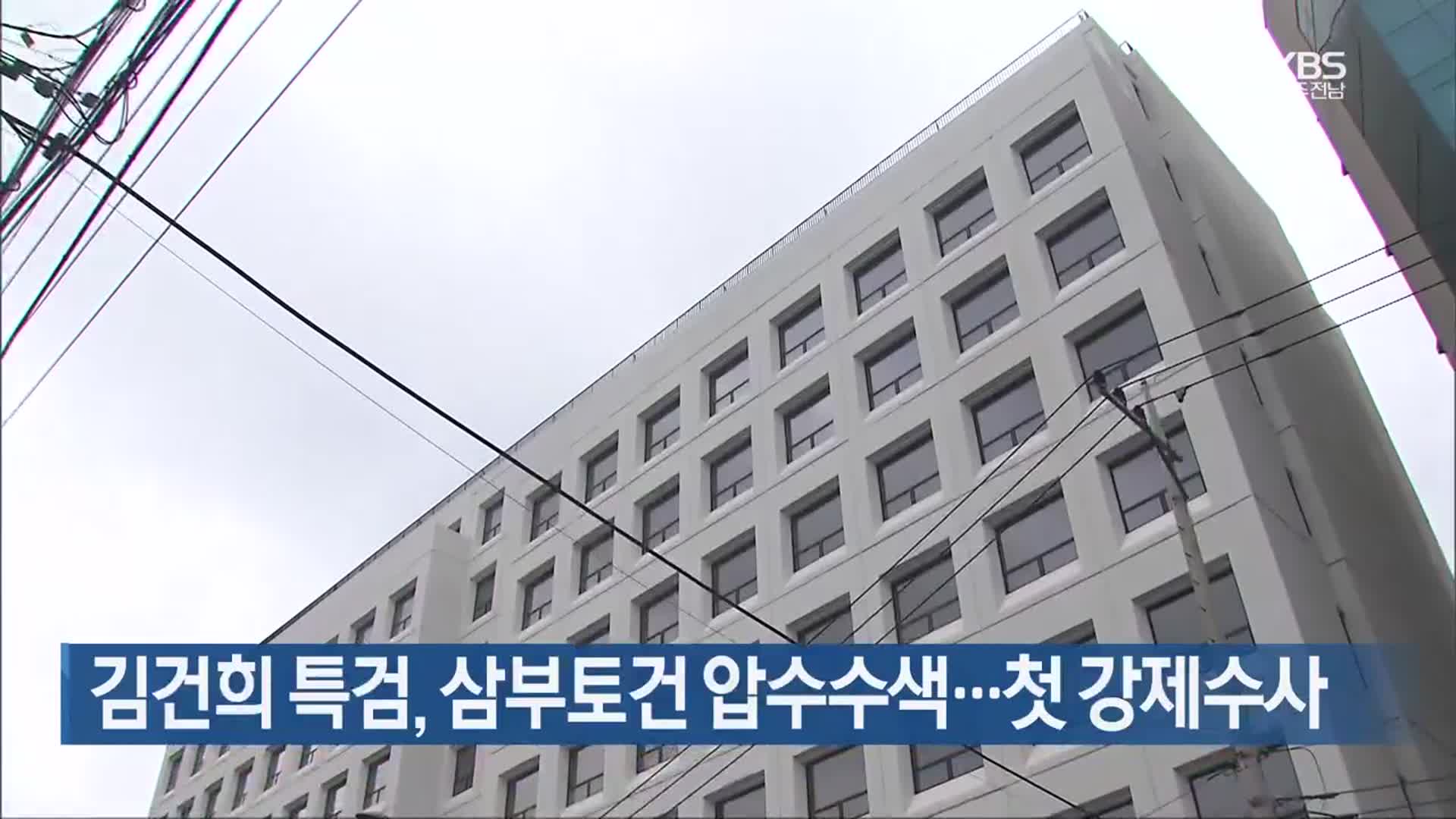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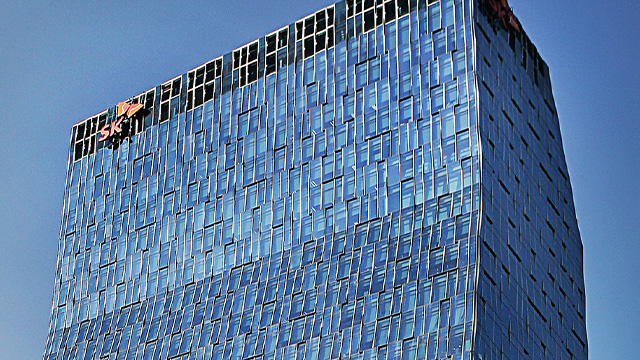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