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민주화운동과 김문수” 일정에서 “그 사람들, 오월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지금뉴스]
입력 2025.05.17 (14:25)
수정 2025.05.17 (14: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17일) 오전 "민주화운동과 김문수"라는 제목의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이 1년여 갇혀있던 광주교도소 터를 찾아 당시 경험과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으로 이후 광주교도소에 투옥됐다 숨진 박관현 열사가 갇혀있던 독방에 자신도 갇혔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5월의 아픔이 승화돼서 더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가 만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5월의 정신은 꼭 남을 미워하거나 또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 있다는,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피 흘리고 고통받는 많은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5.18국립민주묘역에서 자신에게 항의했던 사람들을 향해 "아까도 저보고 고함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오월의 아픔을 알겠습니까?"라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또 인권을 향상시키는 그런 아픔으로 생각하고 더 정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5.17 광주교도소 터 방문)
저는 여기(광주교도소)에 1년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서울구치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1986년 5월에 서울구치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건국대 사태가 있었어요. 건국대 사태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엄청 많이 한꺼번에 구속이 돼 가지고 수백 명이 구속돼서 제가 이제 거기서 나이가 조금 들었기 때문에 주동으로 몰려가지고 벌방에 갇혀가지고 포승줄로 묶고 고문당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안양교도소로 왔다가 안양교도소에 보면 중구금실이 있어요. 중구금실은 교도소 안에 또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 안에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완전히 독방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이제 2심 끝나고 난 다음에 목포교도소 가서 목포교도소에서 1년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6.10 6월 항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헌이 되고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또 노태우 집권하면서 또 그다음에 석방이 안 되고 광주교도소 갔다가 그다음에 88년 올림픽 끝나고 88년 10월 말에 10월 3일 개천절 날 특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년 5개월 감옥 살았는데, 광주교도소에서 1년을 살았어요. 목포에서 1년을 살았고요.
그래서 이 광주교도소에서는 그냥 산 게 아니고 원예반에서 국화 키우고 주력을 했어요. 이제 이러는데 원예반에 주력을 해가지고 매일 이제 거기서 국화 키우고 꽃 키우는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데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주력을 해서 거기에서 광주교도소 그때 좌익 사범이라고 그러죠. 공안 사건이나 좌익 사범들 북한의 남파 간첩 그다음에 재일교포 공작원들 또 재일교포 간첩단 그리고 국내에 운동권들, 같이 한 그때 한 100명 이상 있었어요. 한 120명 됐나… 남민전도 있었어요. 한 120명하고 같이 감옥에 살다가 1988년 올림픽 끝나고 10월 3일날 개천절 특사로 나와서 제 사진 중에 뭐 이렇게 '양심수 전원 석방하라'는 게 이제 이런 사람 석방 안 된 사람들, 남은 사람 석방하라고 그때 이제 외치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광주교도소는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곳인데, 제가 들어가니까 목포에서 광주로 이감을 와서
이때는 우리 빵동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은 나이가 조금 어리니까, 나는 30대 그래서 이제 제가 광주교도소 그 방에 들어가니까 교도관이 하는 소리가 '야 여기 박관현이 죽어 나간 데니까 잘하고 있어', 근데 보니까 벽에 글씨를 긁어놨는데 글씨를 보니까 박관현이 써놓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 이런 걸 써놨는데 그 방에서 제가 또 1년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관현 그러면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생전에 보지는 못했어요. 못했지만 전남대학교 학생회장 하다가 5.18 이후에 도청에서 안 잡히고 도망을 가서 피신하다가 그다음에 늦게 잡혔습니다. 늦게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와서 본인이 전남대학교 학생회장이고 하니까 계속 너무나 본인이 감옥 안이 형편없거든요. 뭐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요즘엔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뭐 신문도 못 보고 일체 바깥 소식을 모르고 너무 이제 감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처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걸핏하면 징벌방에 보내고 그래서 그때도 광주교도소에서도 하여튼 이 전남대 학생들이라든지 목포대 학생 여기 이제 서울에서도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감옥에서 생활하는 자체가 요즘하고 이제 조금 다릅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인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는 너무 감옥에서도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뭐 정말 힘들게 호승에 묶여서 지내기도 하고 벌방에서 계속 많이 지냈는데 그 벌방에 감옥에 벌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광주 교도소라면 정말 너무 이제 아픈 기억이 많은데 아프지만은 또 그러나 저는 이제 국화를 키우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도 국화만 보면은...
광주교도소가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여기는… 목포교도소는 굉장히 좁아요. 1914년에 지은 교도소인데 거기는 너무 좁고, 목포교도소는 오래된 건물이 돼서 누워 있으면 그냥 구더기부터 온갖 그냥 더러운 벌레들이 막 그냥 기어오르고 이러는 참혹한 곳인데 저도 여기 얼굴에 상처가 목포교도소에서 그때 운동 시간을 너무 운동할 시간이 운동장이 손바닥 만한 데인데 거기서 운동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찢어졌는데 밖에 나가려면 또 그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꼬매지를 못하고 그냥 있어도 지금 흉터가 돼 있는데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요즘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목포교도소도 지금 옮겨가지고 무안으로 옮기고 목포 산정동 옮기고 여기도 이제 옮겨가지고 새로운 교도소로 갔는데
이 교도관들도 생활이 교도관은 '반징역'이라고 그러죠. 교도관들도 어렵고 우리 재소자들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교도관들도 이제 힘들고 이러니까 우리가 저항하고 이러면 그냥 고문을 해서 진압을 하고 이제 벌방에 집어넣고 이런 계속 감옥 안에서도 계속 싸우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주교도소는 저는 우리 아까 박관현 씨가 거기 있던 방인데 제가 목포에서 광주로 이감돼가지고 오니까 교도관이 독방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여기가 박관현이 죽어 나간 데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그래서 벽에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낙서도 있고 이런데 정말 박관현이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이제, 저로서는 교도소에서 만난, 죽고 난 뒤에 제가 만난 그런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에 오면 제가 매년 박관현 묘소는 꼭 참배를 하는데 그 누님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누님이 동생을 생각하면 계속 우는데 하여튼 이 아픈 추억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5월이라는 거는 5월 광주 저는 그때 서울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해고가 돼가, 5월달에 이제 전부 해고되고 삼청교육 대상이 돼서 저는 이제 도망가고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삼청교육을 갔어요 노조 제가 위원장인데 부위원장이 삼청교육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해고돼서 두들겨 이래서 보상금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때 80년 5월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픈 역사고, 우리 역사에서는 다시는 없어야 될 힘들고 아픈 역사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그러나 이 아픔을 이기고 우리가 오늘 이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도소에서 우리가 고생했는데, 여기도 우리 광주교도소 동기들이 여기 왔습니다. 나와봐요.
여기 광주교도소 우리 동기들인데 이 '빵동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때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도 계속 연락하는데, 광주교도소에는 특히 북한에서 파견된 장기수들도 있고 또 남쪽에서 이제 간첩죄로 들어와 있었던 친구, 이런 친구들부터 우리 재일교포 간첩들 또 우리는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같이 한 120여 명이 광주에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딛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와 민주주의, 또 인권이 존중되는 이런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아픔이 승화가 돼서 더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가 만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5월의 정신은 꼭 남을 미워하거나 또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이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 있다는,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피 흘리고 고통받는 많은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또는 뭐 아까도 저보고 고함 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오월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또 인권을 향상시키는 그런 아픔으로 생각하고 더 정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으로 이후 광주교도소에 투옥됐다 숨진 박관현 열사가 갇혀있던 독방에 자신도 갇혔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5월의 아픔이 승화돼서 더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가 만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5월의 정신은 꼭 남을 미워하거나 또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 있다는,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피 흘리고 고통받는 많은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5.18국립민주묘역에서 자신에게 항의했던 사람들을 향해 "아까도 저보고 고함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오월의 아픔을 알겠습니까?"라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또 인권을 향상시키는 그런 아픔으로 생각하고 더 정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5.17 광주교도소 터 방문)
저는 여기(광주교도소)에 1년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서울구치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1986년 5월에 서울구치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건국대 사태가 있었어요. 건국대 사태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엄청 많이 한꺼번에 구속이 돼 가지고 수백 명이 구속돼서 제가 이제 거기서 나이가 조금 들었기 때문에 주동으로 몰려가지고 벌방에 갇혀가지고 포승줄로 묶고 고문당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안양교도소로 왔다가 안양교도소에 보면 중구금실이 있어요. 중구금실은 교도소 안에 또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 안에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완전히 독방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이제 2심 끝나고 난 다음에 목포교도소 가서 목포교도소에서 1년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6.10 6월 항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헌이 되고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또 노태우 집권하면서 또 그다음에 석방이 안 되고 광주교도소 갔다가 그다음에 88년 올림픽 끝나고 88년 10월 말에 10월 3일 개천절 날 특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년 5개월 감옥 살았는데, 광주교도소에서 1년을 살았어요. 목포에서 1년을 살았고요.
그래서 이 광주교도소에서는 그냥 산 게 아니고 원예반에서 국화 키우고 주력을 했어요. 이제 이러는데 원예반에 주력을 해가지고 매일 이제 거기서 국화 키우고 꽃 키우는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데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주력을 해서 거기에서 광주교도소 그때 좌익 사범이라고 그러죠. 공안 사건이나 좌익 사범들 북한의 남파 간첩 그다음에 재일교포 공작원들 또 재일교포 간첩단 그리고 국내에 운동권들, 같이 한 그때 한 100명 이상 있었어요. 한 120명 됐나… 남민전도 있었어요. 한 120명하고 같이 감옥에 살다가 1988년 올림픽 끝나고 10월 3일날 개천절 특사로 나와서 제 사진 중에 뭐 이렇게 '양심수 전원 석방하라'는 게 이제 이런 사람 석방 안 된 사람들, 남은 사람 석방하라고 그때 이제 외치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광주교도소는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곳인데, 제가 들어가니까 목포에서 광주로 이감을 와서
이때는 우리 빵동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은 나이가 조금 어리니까, 나는 30대 그래서 이제 제가 광주교도소 그 방에 들어가니까 교도관이 하는 소리가 '야 여기 박관현이 죽어 나간 데니까 잘하고 있어', 근데 보니까 벽에 글씨를 긁어놨는데 글씨를 보니까 박관현이 써놓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 이런 걸 써놨는데 그 방에서 제가 또 1년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관현 그러면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생전에 보지는 못했어요. 못했지만 전남대학교 학생회장 하다가 5.18 이후에 도청에서 안 잡히고 도망을 가서 피신하다가 그다음에 늦게 잡혔습니다. 늦게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와서 본인이 전남대학교 학생회장이고 하니까 계속 너무나 본인이 감옥 안이 형편없거든요. 뭐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요즘엔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뭐 신문도 못 보고 일체 바깥 소식을 모르고 너무 이제 감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처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걸핏하면 징벌방에 보내고 그래서 그때도 광주교도소에서도 하여튼 이 전남대 학생들이라든지 목포대 학생 여기 이제 서울에서도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감옥에서 생활하는 자체가 요즘하고 이제 조금 다릅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인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는 너무 감옥에서도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뭐 정말 힘들게 호승에 묶여서 지내기도 하고 벌방에서 계속 많이 지냈는데 그 벌방에 감옥에 벌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광주 교도소라면 정말 너무 이제 아픈 기억이 많은데 아프지만은 또 그러나 저는 이제 국화를 키우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도 국화만 보면은...
광주교도소가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여기는… 목포교도소는 굉장히 좁아요. 1914년에 지은 교도소인데 거기는 너무 좁고, 목포교도소는 오래된 건물이 돼서 누워 있으면 그냥 구더기부터 온갖 그냥 더러운 벌레들이 막 그냥 기어오르고 이러는 참혹한 곳인데 저도 여기 얼굴에 상처가 목포교도소에서 그때 운동 시간을 너무 운동할 시간이 운동장이 손바닥 만한 데인데 거기서 운동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찢어졌는데 밖에 나가려면 또 그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꼬매지를 못하고 그냥 있어도 지금 흉터가 돼 있는데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요즘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목포교도소도 지금 옮겨가지고 무안으로 옮기고 목포 산정동 옮기고 여기도 이제 옮겨가지고 새로운 교도소로 갔는데
이 교도관들도 생활이 교도관은 '반징역'이라고 그러죠. 교도관들도 어렵고 우리 재소자들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교도관들도 이제 힘들고 이러니까 우리가 저항하고 이러면 그냥 고문을 해서 진압을 하고 이제 벌방에 집어넣고 이런 계속 감옥 안에서도 계속 싸우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주교도소는 저는 우리 아까 박관현 씨가 거기 있던 방인데 제가 목포에서 광주로 이감돼가지고 오니까 교도관이 독방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여기가 박관현이 죽어 나간 데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그래서 벽에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낙서도 있고 이런데 정말 박관현이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이제, 저로서는 교도소에서 만난, 죽고 난 뒤에 제가 만난 그런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에 오면 제가 매년 박관현 묘소는 꼭 참배를 하는데 그 누님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누님이 동생을 생각하면 계속 우는데 하여튼 이 아픈 추억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5월이라는 거는 5월 광주 저는 그때 서울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해고가 돼가, 5월달에 이제 전부 해고되고 삼청교육 대상이 돼서 저는 이제 도망가고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삼청교육을 갔어요 노조 제가 위원장인데 부위원장이 삼청교육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해고돼서 두들겨 이래서 보상금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때 80년 5월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픈 역사고, 우리 역사에서는 다시는 없어야 될 힘들고 아픈 역사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그러나 이 아픔을 이기고 우리가 오늘 이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도소에서 우리가 고생했는데, 여기도 우리 광주교도소 동기들이 여기 왔습니다. 나와봐요.
여기 광주교도소 우리 동기들인데 이 '빵동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때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도 계속 연락하는데, 광주교도소에는 특히 북한에서 파견된 장기수들도 있고 또 남쪽에서 이제 간첩죄로 들어와 있었던 친구, 이런 친구들부터 우리 재일교포 간첩들 또 우리는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같이 한 120여 명이 광주에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딛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와 민주주의, 또 인권이 존중되는 이런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아픔이 승화가 돼서 더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가 만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5월의 정신은 꼭 남을 미워하거나 또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이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 있다는,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피 흘리고 고통받는 많은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또는 뭐 아까도 저보고 고함 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오월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또 인권을 향상시키는 그런 아픔으로 생각하고 더 정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문수 “민주화운동과 김문수” 일정에서 “그 사람들, 오월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지금뉴스]
-
- 입력 2025-05-17 14:25:13
- 수정2025-05-17 14:25:33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17일) 오전 "민주화운동과 김문수"라는 제목의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이 1년여 갇혀있던 광주교도소 터를 찾아 당시 경험과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으로 이후 광주교도소에 투옥됐다 숨진 박관현 열사가 갇혀있던 독방에 자신도 갇혔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5월의 아픔이 승화돼서 더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가 만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5월의 정신은 꼭 남을 미워하거나 또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 있다는,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피 흘리고 고통받는 많은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5.18국립민주묘역에서 자신에게 항의했던 사람들을 향해 "아까도 저보고 고함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오월의 아픔을 알겠습니까?"라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또 인권을 향상시키는 그런 아픔으로 생각하고 더 정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5.17 광주교도소 터 방문)
저는 여기(광주교도소)에 1년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서울구치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1986년 5월에 서울구치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건국대 사태가 있었어요. 건국대 사태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엄청 많이 한꺼번에 구속이 돼 가지고 수백 명이 구속돼서 제가 이제 거기서 나이가 조금 들었기 때문에 주동으로 몰려가지고 벌방에 갇혀가지고 포승줄로 묶고 고문당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안양교도소로 왔다가 안양교도소에 보면 중구금실이 있어요. 중구금실은 교도소 안에 또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 안에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완전히 독방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이제 2심 끝나고 난 다음에 목포교도소 가서 목포교도소에서 1년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6.10 6월 항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헌이 되고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또 노태우 집권하면서 또 그다음에 석방이 안 되고 광주교도소 갔다가 그다음에 88년 올림픽 끝나고 88년 10월 말에 10월 3일 개천절 날 특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년 5개월 감옥 살았는데, 광주교도소에서 1년을 살았어요. 목포에서 1년을 살았고요.
그래서 이 광주교도소에서는 그냥 산 게 아니고 원예반에서 국화 키우고 주력을 했어요. 이제 이러는데 원예반에 주력을 해가지고 매일 이제 거기서 국화 키우고 꽃 키우는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데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주력을 해서 거기에서 광주교도소 그때 좌익 사범이라고 그러죠. 공안 사건이나 좌익 사범들 북한의 남파 간첩 그다음에 재일교포 공작원들 또 재일교포 간첩단 그리고 국내에 운동권들, 같이 한 그때 한 100명 이상 있었어요. 한 120명 됐나… 남민전도 있었어요. 한 120명하고 같이 감옥에 살다가 1988년 올림픽 끝나고 10월 3일날 개천절 특사로 나와서 제 사진 중에 뭐 이렇게 '양심수 전원 석방하라'는 게 이제 이런 사람 석방 안 된 사람들, 남은 사람 석방하라고 그때 이제 외치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광주교도소는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곳인데, 제가 들어가니까 목포에서 광주로 이감을 와서
이때는 우리 빵동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은 나이가 조금 어리니까, 나는 30대 그래서 이제 제가 광주교도소 그 방에 들어가니까 교도관이 하는 소리가 '야 여기 박관현이 죽어 나간 데니까 잘하고 있어', 근데 보니까 벽에 글씨를 긁어놨는데 글씨를 보니까 박관현이 써놓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 이런 걸 써놨는데 그 방에서 제가 또 1년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관현 그러면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생전에 보지는 못했어요. 못했지만 전남대학교 학생회장 하다가 5.18 이후에 도청에서 안 잡히고 도망을 가서 피신하다가 그다음에 늦게 잡혔습니다. 늦게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와서 본인이 전남대학교 학생회장이고 하니까 계속 너무나 본인이 감옥 안이 형편없거든요. 뭐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요즘엔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뭐 신문도 못 보고 일체 바깥 소식을 모르고 너무 이제 감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처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걸핏하면 징벌방에 보내고 그래서 그때도 광주교도소에서도 하여튼 이 전남대 학생들이라든지 목포대 학생 여기 이제 서울에서도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감옥에서 생활하는 자체가 요즘하고 이제 조금 다릅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인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는 너무 감옥에서도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뭐 정말 힘들게 호승에 묶여서 지내기도 하고 벌방에서 계속 많이 지냈는데 그 벌방에 감옥에 벌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광주 교도소라면 정말 너무 이제 아픈 기억이 많은데 아프지만은 또 그러나 저는 이제 국화를 키우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도 국화만 보면은...
광주교도소가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여기는… 목포교도소는 굉장히 좁아요. 1914년에 지은 교도소인데 거기는 너무 좁고, 목포교도소는 오래된 건물이 돼서 누워 있으면 그냥 구더기부터 온갖 그냥 더러운 벌레들이 막 그냥 기어오르고 이러는 참혹한 곳인데 저도 여기 얼굴에 상처가 목포교도소에서 그때 운동 시간을 너무 운동할 시간이 운동장이 손바닥 만한 데인데 거기서 운동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찢어졌는데 밖에 나가려면 또 그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꼬매지를 못하고 그냥 있어도 지금 흉터가 돼 있는데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요즘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목포교도소도 지금 옮겨가지고 무안으로 옮기고 목포 산정동 옮기고 여기도 이제 옮겨가지고 새로운 교도소로 갔는데
이 교도관들도 생활이 교도관은 '반징역'이라고 그러죠. 교도관들도 어렵고 우리 재소자들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교도관들도 이제 힘들고 이러니까 우리가 저항하고 이러면 그냥 고문을 해서 진압을 하고 이제 벌방에 집어넣고 이런 계속 감옥 안에서도 계속 싸우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주교도소는 저는 우리 아까 박관현 씨가 거기 있던 방인데 제가 목포에서 광주로 이감돼가지고 오니까 교도관이 독방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여기가 박관현이 죽어 나간 데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그래서 벽에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낙서도 있고 이런데 정말 박관현이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이제, 저로서는 교도소에서 만난, 죽고 난 뒤에 제가 만난 그런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에 오면 제가 매년 박관현 묘소는 꼭 참배를 하는데 그 누님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누님이 동생을 생각하면 계속 우는데 하여튼 이 아픈 추억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5월이라는 거는 5월 광주 저는 그때 서울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해고가 돼가, 5월달에 이제 전부 해고되고 삼청교육 대상이 돼서 저는 이제 도망가고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삼청교육을 갔어요 노조 제가 위원장인데 부위원장이 삼청교육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해고돼서 두들겨 이래서 보상금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때 80년 5월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픈 역사고, 우리 역사에서는 다시는 없어야 될 힘들고 아픈 역사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그러나 이 아픔을 이기고 우리가 오늘 이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도소에서 우리가 고생했는데, 여기도 우리 광주교도소 동기들이 여기 왔습니다. 나와봐요.
여기 광주교도소 우리 동기들인데 이 '빵동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때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도 계속 연락하는데, 광주교도소에는 특히 북한에서 파견된 장기수들도 있고 또 남쪽에서 이제 간첩죄로 들어와 있었던 친구, 이런 친구들부터 우리 재일교포 간첩들 또 우리는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같이 한 120여 명이 광주에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딛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와 민주주의, 또 인권이 존중되는 이런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아픔이 승화가 돼서 더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가 만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5월의 정신은 꼭 남을 미워하거나 또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이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 있다는,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피 흘리고 고통받는 많은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또는 뭐 아까도 저보고 고함 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오월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또 인권을 향상시키는 그런 아픔으로 생각하고 더 정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으로 이후 광주교도소에 투옥됐다 숨진 박관현 열사가 갇혀있던 독방에 자신도 갇혔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5월의 아픔이 승화돼서 더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가 만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5월의 정신은 꼭 남을 미워하거나 또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 있다는,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피 흘리고 고통받는 많은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5.18국립민주묘역에서 자신에게 항의했던 사람들을 향해 "아까도 저보고 고함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오월의 아픔을 알겠습니까?"라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또 인권을 향상시키는 그런 아픔으로 생각하고 더 정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5.17 광주교도소 터 방문)
저는 여기(광주교도소)에 1년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서울구치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1986년 5월에 서울구치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건국대 사태가 있었어요. 건국대 사태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엄청 많이 한꺼번에 구속이 돼 가지고 수백 명이 구속돼서 제가 이제 거기서 나이가 조금 들었기 때문에 주동으로 몰려가지고 벌방에 갇혀가지고 포승줄로 묶고 고문당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안양교도소로 왔다가 안양교도소에 보면 중구금실이 있어요. 중구금실은 교도소 안에 또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 안에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완전히 독방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이제 2심 끝나고 난 다음에 목포교도소 가서 목포교도소에서 1년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6.10 6월 항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헌이 되고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또 노태우 집권하면서 또 그다음에 석방이 안 되고 광주교도소 갔다가 그다음에 88년 올림픽 끝나고 88년 10월 말에 10월 3일 개천절 날 특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년 5개월 감옥 살았는데, 광주교도소에서 1년을 살았어요. 목포에서 1년을 살았고요.
그래서 이 광주교도소에서는 그냥 산 게 아니고 원예반에서 국화 키우고 주력을 했어요. 이제 이러는데 원예반에 주력을 해가지고 매일 이제 거기서 국화 키우고 꽃 키우는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데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주력을 해서 거기에서 광주교도소 그때 좌익 사범이라고 그러죠. 공안 사건이나 좌익 사범들 북한의 남파 간첩 그다음에 재일교포 공작원들 또 재일교포 간첩단 그리고 국내에 운동권들, 같이 한 그때 한 100명 이상 있었어요. 한 120명 됐나… 남민전도 있었어요. 한 120명하고 같이 감옥에 살다가 1988년 올림픽 끝나고 10월 3일날 개천절 특사로 나와서 제 사진 중에 뭐 이렇게 '양심수 전원 석방하라'는 게 이제 이런 사람 석방 안 된 사람들, 남은 사람 석방하라고 그때 이제 외치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광주교도소는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곳인데, 제가 들어가니까 목포에서 광주로 이감을 와서
이때는 우리 빵동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은 나이가 조금 어리니까, 나는 30대 그래서 이제 제가 광주교도소 그 방에 들어가니까 교도관이 하는 소리가 '야 여기 박관현이 죽어 나간 데니까 잘하고 있어', 근데 보니까 벽에 글씨를 긁어놨는데 글씨를 보니까 박관현이 써놓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 이런 걸 써놨는데 그 방에서 제가 또 1년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관현 그러면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생전에 보지는 못했어요. 못했지만 전남대학교 학생회장 하다가 5.18 이후에 도청에서 안 잡히고 도망을 가서 피신하다가 그다음에 늦게 잡혔습니다. 늦게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와서 본인이 전남대학교 학생회장이고 하니까 계속 너무나 본인이 감옥 안이 형편없거든요. 뭐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요즘엔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뭐 신문도 못 보고 일체 바깥 소식을 모르고 너무 이제 감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처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걸핏하면 징벌방에 보내고 그래서 그때도 광주교도소에서도 하여튼 이 전남대 학생들이라든지 목포대 학생 여기 이제 서울에서도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감옥에서 생활하는 자체가 요즘하고 이제 조금 다릅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인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는 너무 감옥에서도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뭐 정말 힘들게 호승에 묶여서 지내기도 하고 벌방에서 계속 많이 지냈는데 그 벌방에 감옥에 벌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광주 교도소라면 정말 너무 이제 아픈 기억이 많은데 아프지만은 또 그러나 저는 이제 국화를 키우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도 국화만 보면은...
광주교도소가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여기는… 목포교도소는 굉장히 좁아요. 1914년에 지은 교도소인데 거기는 너무 좁고, 목포교도소는 오래된 건물이 돼서 누워 있으면 그냥 구더기부터 온갖 그냥 더러운 벌레들이 막 그냥 기어오르고 이러는 참혹한 곳인데 저도 여기 얼굴에 상처가 목포교도소에서 그때 운동 시간을 너무 운동할 시간이 운동장이 손바닥 만한 데인데 거기서 운동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찢어졌는데 밖에 나가려면 또 그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꼬매지를 못하고 그냥 있어도 지금 흉터가 돼 있는데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요즘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목포교도소도 지금 옮겨가지고 무안으로 옮기고 목포 산정동 옮기고 여기도 이제 옮겨가지고 새로운 교도소로 갔는데
이 교도관들도 생활이 교도관은 '반징역'이라고 그러죠. 교도관들도 어렵고 우리 재소자들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교도관들도 이제 힘들고 이러니까 우리가 저항하고 이러면 그냥 고문을 해서 진압을 하고 이제 벌방에 집어넣고 이런 계속 감옥 안에서도 계속 싸우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주교도소는 저는 우리 아까 박관현 씨가 거기 있던 방인데 제가 목포에서 광주로 이감돼가지고 오니까 교도관이 독방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여기가 박관현이 죽어 나간 데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그래서 벽에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낙서도 있고 이런데 정말 박관현이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이제, 저로서는 교도소에서 만난, 죽고 난 뒤에 제가 만난 그런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에 오면 제가 매년 박관현 묘소는 꼭 참배를 하는데 그 누님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누님이 동생을 생각하면 계속 우는데 하여튼 이 아픈 추억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5월이라는 거는 5월 광주 저는 그때 서울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해고가 돼가, 5월달에 이제 전부 해고되고 삼청교육 대상이 돼서 저는 이제 도망가고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삼청교육을 갔어요 노조 제가 위원장인데 부위원장이 삼청교육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해고돼서 두들겨 이래서 보상금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때 80년 5월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픈 역사고, 우리 역사에서는 다시는 없어야 될 힘들고 아픈 역사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그러나 이 아픔을 이기고 우리가 오늘 이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도소에서 우리가 고생했는데, 여기도 우리 광주교도소 동기들이 여기 왔습니다. 나와봐요.
여기 광주교도소 우리 동기들인데 이 '빵동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때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도 계속 연락하는데, 광주교도소에는 특히 북한에서 파견된 장기수들도 있고 또 남쪽에서 이제 간첩죄로 들어와 있었던 친구, 이런 친구들부터 우리 재일교포 간첩들 또 우리는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같이 한 120여 명이 광주에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딛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와 민주주의, 또 인권이 존중되는 이런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아픔이 승화가 돼서 더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가 만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5월의 정신은 꼭 남을 미워하거나 또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이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 있다는,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피 흘리고 고통받는 많은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또는 뭐 아까도 저보고 고함 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오월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또 인권을 향상시키는 그런 아픔으로 생각하고 더 정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김세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제 21대 대통령 선거












![김상욱 이어 김용남도 이재명 안았다…“꽤 싸웠는데 이제 한편” [지금뉴스]](/data/fckeditor/vod/2025/05/17/174091747466689040.png)


![[단독] ‘홈플러스 채권 사기 의혹’ 정점 김병주 MBK 회장 귀국…검찰, 압수수색](/data/news/2025/05/17/20250517_ZhDC4U.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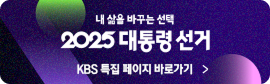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